미술관의 빈틈을 건드리는 반가운 작업이었다. 여기서 말하는 ‘빈틈’은, 당연히 정돈되어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장소다. 편지지에 적힌 이름 “아버지의 마음-담양”을 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하면, 액자로 표구되지 않았(을 것으로 추정되)고, 기본 정보 외 아무런 설명 없는 사진 작품이 나온다. 아마 전시된 적 없는 사진이어서 표구를 하지 않았을 듯하다. 이어서 강봉규라는 작가 이름을 검색하면, 작품설명 없는 수많은 사진들과 함께 2016년 하반기에 열린 ’기증작가초대전‘에 관한 정보가 나온다. 작가의 미술관 소장작품들은 ‘2017-’로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달고 있다. 이 번호는 전시가 열린 다음 연도인 2017년을 뜻한다. 작가의 사진들은 이때 소장품으로 등록되면서 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이다. 소장품으로 등록된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살펴보니, 여러 작품에 걸쳐 각 사진의 화면 속에 사람의 형상이 비친다. 이 실루엣이 보이는 이유는 비전문가인 촬영자가(아마도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담당자가) 액자에 표구된 상태 그대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탓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, 그럼에도 이 사진들의 작품 정보에 액자 규격은 적혀있지 않다. 소장품 정보에 액자 규격을 기재하는 특정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. 어찌되었든 소장품으로 등록되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많은 사진들 속에는, 임시적인 기록 촬영의 흔적과 촬영자의 흔적이 남아 있다. 이 흔적들은 미술관의 빈틈 속에 있다. 이 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못 한 채 임시 상태로 남은 수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거나 산재해 있다. 이 빈틈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시되지 않(았)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시적인 흔적의 상태로 남는다.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시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.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큰 문제의 뒤편으로 밀려난다. 빈틈은 이러한 것들이 머무는 장소다. 빈틈을 건드리는 작업이 반가운 이유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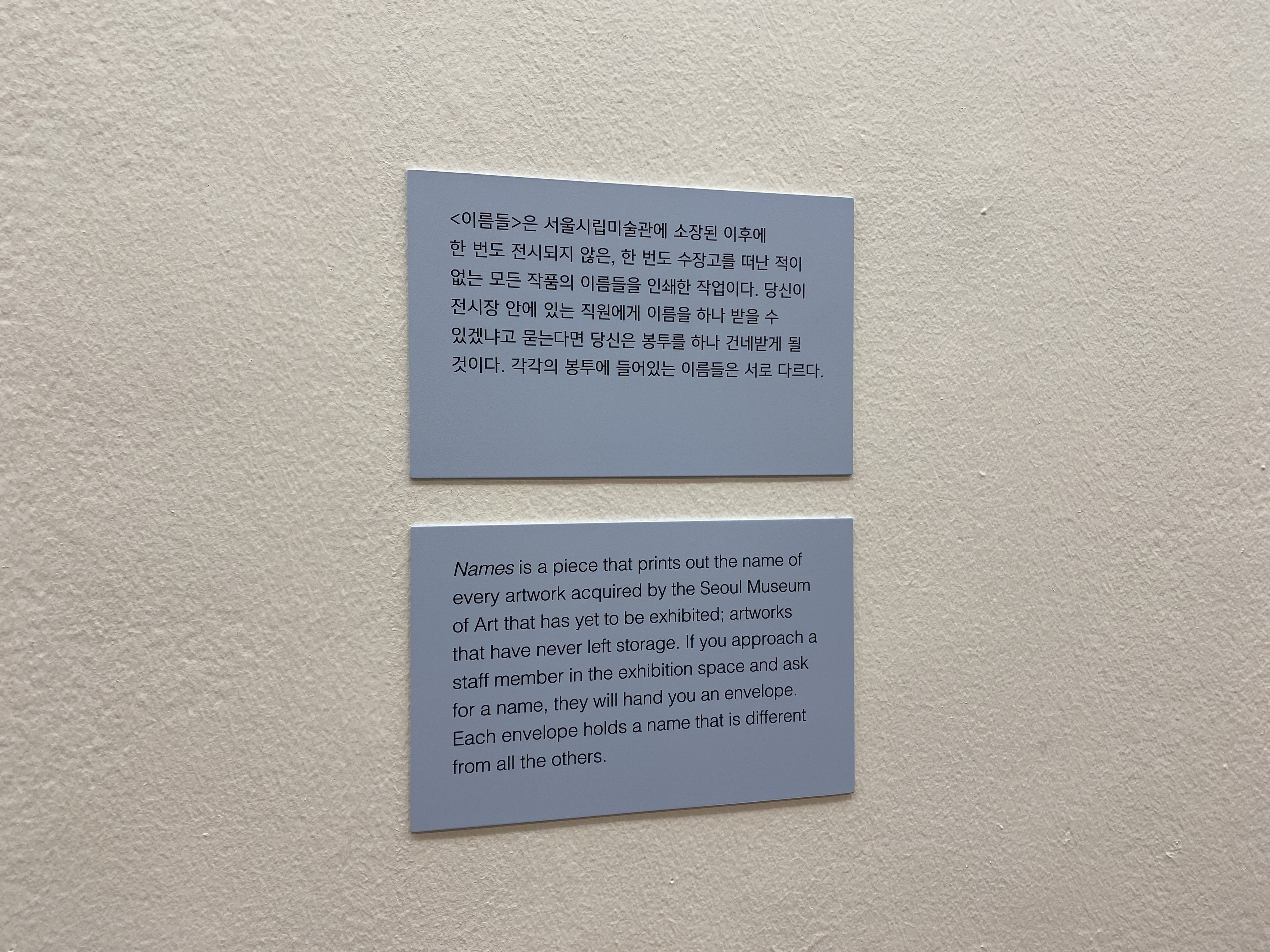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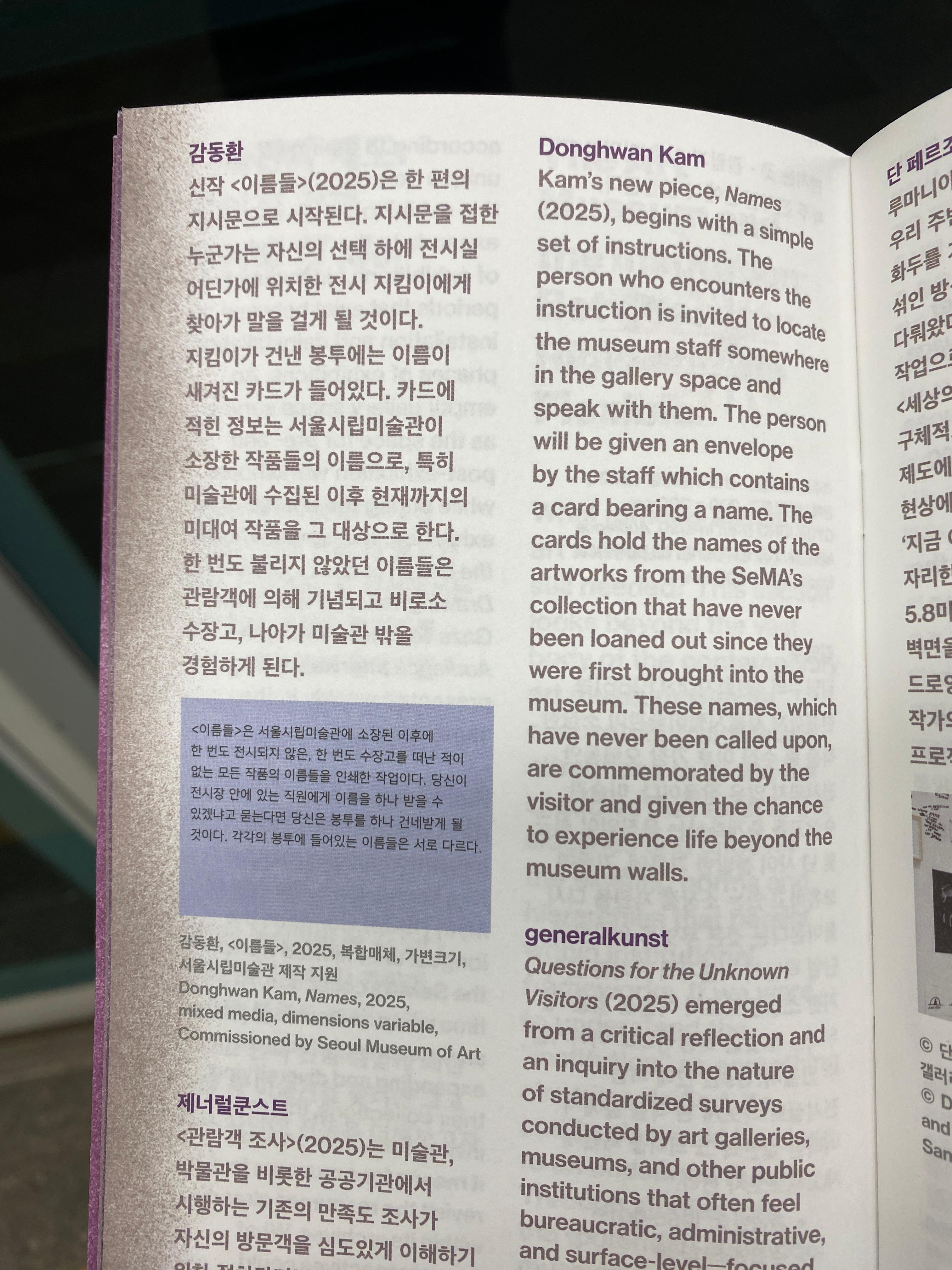



'(미술(예술) > 목격과 기록과 생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《flop: 규칙과 반칙의 변증법》 메모(2023.8.6. 메모) (0) | 2025.07.02 |
|---|---|
| 서혜연 《Skin palette—bone and seed》(오온, 2025.6.4.~6.22.) (0) | 2025.06.23 |
| 김익현 《사진 전》 (0) | 2025.05.13 |
| 김성환 개인전 《Ua a‘o ‘ia ‘o ia e ia 우아 아오 이아 오 이아 에 이아》 (0) | 2025.03.26 |
| (메모)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《큰 사과가 소리없이》 (0) | 2024.10.06 |